|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단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는 취지로 승소금액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채권자(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간 합의에 불과해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엔나협약의 위반 여부와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일본 정부가 이번 재산명시결정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결정이 취소되며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뱅크시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유한일 상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1052t.jpg)
![[포토]'대화하는 윤재옥-이철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1021t.jpg)
![[포토] 이태희 '호쾌한 스윙으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260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686t.jpg)
![[포토]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648t.jpg)
![[포토] 티파니 영, 매력적인 미모](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221t.jpg)
![[포토]'손하트하는 이재명-조희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935t.jpg)
![[포토]코스피, 0.4% 상승…외인·기관 매수에 2740선 회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99t.jpg)
![[포토]'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52t.jpg)
![[포토]오색연등으로 물든 조계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789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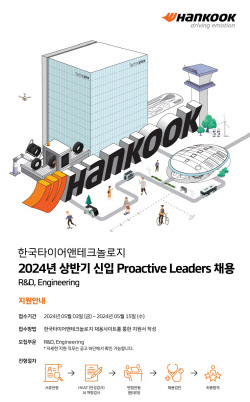
![[포토] 김홍택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