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먼저 몇 구절 읽고 시작하자. “혀 위에서 녹아들어야 하지만 가루가 돼서는 안 된다. 짜지 않아야 하지만 싱거워도 안 된다. 고소한 향이 풍겨야 하지만 기름기가 입에 걸려서도 안 된다. 그게 보푸름이 앉아 있어야 할 정밀한 좌표였고, 그 지점을 가장 섬세하게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엄마였다.”
“배추적은 ‘깊은 맛’을 가진 음식이었다. 깊은 맛이란 게 도대체 뭐냐? 물으면 ‘얕은 맛’과 반대라고 대답하는 게 최선이란 소리다. 얕은 맛이란 혀에서만 단, 달게 먹고 난 후엔 조금 민망해지는 그런 맛이다. 그러나 깊은 맛은 반대다. 먹고 나서 전혀 죄스럽지가 않다. 빈 접시가 부끄러울 리 없다.”
앞엣것은 ‘명태 보푸름’ 얘기고, 뒤엣것은 ‘배추적’ 얘기다. 혀로 감고 눈으로 먹는 음식이 차고 넘치는 세상, 그들이 뿜어내는 웬만한 맛에는 단련이 됐을 법한데 이건 또 무슨 맛인가. 좀더 친절한 덧붙임이 필요하다면 이번엔 맵싸하게 가보자. ‘고추는 맵다’를 공식처럼 끌어안고 있는 이들에게 던지는 점잖은 가르침 한 수다. “고춧가루가 겸허했다면 부빈 고추는 도도했다”고 했다. 맑은 국엔 수더분한 촌아낙처럼 어물쩡한 고춧가루가 아니라 귀부인처럼 쌀쌀맞고 도도한 부빈 고추를 써야 제격이라고. 그러곤 이 위에 길쭉한 못 하나 들여박는 일도 잊지 않았다. “성분이 같으면 맛이야 당연히 같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 모두는 칼럼니스트 김서령(1956∼2018)의 것이다. 향은 물론이고 색도 특별한, 무엇보다 개성이 강한 맛을 가진 음식이야기로 한 상을 차려냈다. ‘성분이 같다고 당연히 같은 글이 아닌’ 차림이다. 하지만 정작 상을 낸 이는 지금 없다. 암 투병 끝에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예순둘이었으니, 지나치게 서둔 길이었다. 서러운 것이 떠난 사람인지 잃은 맛인지, 그 답도 없이 홀연히 사라진 야속함은 서른여편으로 묶어낸 유고집으로 달래라 한다.
▲히수무레하고 수수하고 슴슴한 ‘맛’
|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주는 ‘고담한’ 국수를 말고, ‘들큰 알싸한’ 집장을 담그고, ‘새근한’ 증편을 쪄낸다. 여기에 ‘개결한 명태 보푸름’은 뭐고, ‘슴슴한 무익지’는 또 뭔지. ‘호박뭉개미’도 알 듯 모를 듯한데 ‘온순하고 착한’ 호박뭉개미란다. ‘우주 운행의 질서를 함축하는 상징’이란 냉잇국도 있다. 그러고선 이렇게 붙였다. “기억은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속성이 있다. 다 잊은 줄 알았던 옛 부엌의 아침과 저녁들이 앞다퉈 떠오른다”고.
내친김에 그 부엌을 찾아 깨소금국수에 얹은 감칠맛 한 번 보자. “맑고 히수무레하고 수수하고 슴슴하고 조용하고 의젓하고 살뜰하고 고담하고 소박한 것”이라고 썼다. 그 마무리는 ‘가진 자의 여유’로 했다. 난데없는 고백 한 마디다. 이 독특한 수식들은 백석(1912∼1996)의 시 ‘국수’에서 따왔노라고. 그의 시가 ‘히수무레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고담하고 소박한 것’을 먼저 말했더라고. 그래도 배경은 내 고향이라고, 시를 볼 때마다 백석의 평안도 어느 마을이 아니라 김서령의 임하 안방의 안반과 홍두깨 근처를 서성인다고.
백석은 저자가 유독 마음을 준 이다. 가자미 한 마리를 살 때도, 연변이란 팥소 든 밀가루떡을 떠올릴 때도 백석을 불러냈다. “나와 똑같은 정서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맞다. 백석이 그렇지 않았나. 방언으로 세련된 모더니즘을 구사하고, 지방이니 민속이니 토속적인 표현을 즐겼더랬다. 저자가 제목으로 올린 ‘배추적’ 역시 배추전의 영남사투리. 배추적만이 아니다. 지금 막 방언사전에서 뽑아낸 듯한 말들은 책에 차고 넘친다. 백석이 그랬듯 굳이 구해냈을 거다. “단어 하나를 새롭게 살려내는 기쁨을 어디에다 비할까”란 수선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 말이다.
▲관조 섞인 철학까지 끓여낸 풍미
그냥 음식에세이려니 해둘 게 아니다. 생선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낱 수박에까지 엮어낸 역사는 물론, 그들을 바라보는 관조 섞인 삶의 철학까지 아우르고 있으니. 안동 종갓집 출신답게 부엌은 당연하고 안채와 사랑채에까지 고루 뿌린 시선을 따라잡는 재미는 덤이다. 그러니 흐르는 대로 읽어내는 게 좋다. 생소한 단어가 막으면 막는 대로, 덕지덕지 묻힌 사투리가 거슬리면 거슬리는 대로, 글보다 먼저 흐르는 그림이 읽는 일을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누구는 ‘문장이 주는 치유적 힘’으로 떠난 이의 부재를 위로하겠단다. 하지만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듯하다. 무조건 아까워서다. 침 고이고 눈물 고이고 그러다가 죽비처럼 내리쳐 뒤통수까지 얼얼하게 한 그 한 줄 한 줄을 치유로만 볼 건 아닌 듯해서다. 그이의 말대로 삶이 ‘삶은 나물’보다 못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 어쩌겠나. 그저 즐겁게 먹을 일이다, 그이가 차려준 대로. 한 상 넙죽 받고 배추적도 우걱 씹고. 끝까지 음미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할 일이다.
미처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원고는 ‘간고등어’ 편에 멈춰 있다. 가운데 토막이 잘려나간 고등어구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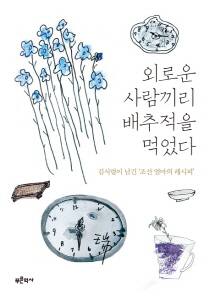






![[포토]명동성당 성탄 대축일 미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76t.jpg)
![[포토]크리스마스엔 스케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45t.jpg)
![[포토]37번째 거리 성탄예배 열려 방한복·도시락으로 사랑 나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31t.jpg)
![[포토]조국혁신당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19t.jpg)
![[포토]우리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173t.jpg)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