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은 이같이 환경과 성장은 대척점에 있다는 전통 사고방식에 도전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1987년 ‘UN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소비변화는 올 초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제3 실무그룹 보고서 ‘완화’편에도 언급됐다. 주로 공급 측면의 대응을 다룬 앞선 보고서들과 달리 수요 측면의 대응을 처음 언급했다.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관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2050년까지 40~7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채식, 음식물쓰레기 감소, 전기차, 대중교통 활용 등 소비변화를 통해 큰 폭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IPCC는 소개했다.
그러나 미시적 실천방식으로 들어오면 모호하게 느껴진다. 대체육을 찾아서 먹고, 가능한 소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기업을 압박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사회와 정치에 위임하고 무임승차할 것인가.
개인과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의 역사실험은 거의 실패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제 패러다임은 단언컨대 지속하지 못한다.
문제는 미래 세대와 공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현재로선 그저 답을 찾기 어려운 파편화된 개인과제로만 느껴진다는 점이다.
다음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소비에 쿨하고, 까칠한 독일인에 대한 관찰기다.
물질적이고 과시적인 소비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팬시(Fancy)’하고, ‘힙(hip)’하고, ‘트렌디(trendy)’하고, ‘핫(hot)’하다는 용어들이 우후죽순 비판없이 소비되고 있다. 소위 ‘유행템’을 파악해 전파하는 인플루언서들과 유행템을 만들어내는 셀럽과 패션산업의 공생생태계도 두텁다.
반면 백화점에 아무렇게나 진열된 물건을 보면 ‘선진국이 맞을까’란 생각이 들다가도, 독일인들이 열정을 보이는 지점이 물질소비가 아니라는 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만일 당신이 등산복 애호가라면 독일에서는 이질적이지 않게 거리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도이터 백팩과 등산화는 독일의 전 세대에 걸친 유행템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능에 충실한 아웃도어 제품을 걸친 이들이 도심의 쇼핑거리를 활보한다. 명품가방이 드물고, 등산화가 흔한 모습은 낯설었다.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기능에 충실한 소비성향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
일례로 코로나19 이후 독일의 명품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의 명품 소비 규모는 경제규모와 함께 증가세를 보이지만, 연 3%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보여왔다.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요 수요 중 하나로 아시아와 러시아 등 관광객 수요가 큰 축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로 관광객 수요가 사라진 독일의 명품 수요는 급감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슈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명품 소비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자전거, 여행, 등산,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과 체험 소비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유별나다. 기후위기 시대 독일인들의 팬시함을 드러내는 소비방식이다. 특히 자전거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서 트램과 자전거, 자동차가 하나의 도로에서 동시에 달리고 자전거용 신호등은 도보용 신호등과 별개로 작동한다. 어린이 자전거 시트(Fahrrad Kindersitz)에 5세 이하 영유아를 태우고 온 가족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독일 국민들이 자전거 주행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소비와 성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의 소비방식은 환경을 고려한 소비에 있다. 독일 소비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으로 5명 중 4명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한다고 답했으며, 독일의 학부형들은 자녀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Fridays for future)’에 나갈 수 있도록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공공연히 한다.
독일의 환경보호에 대한 집착은 1970년대 독일의 녹색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갖는 공통의 기억인 ‘집단기억’은 파편화된 개인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주요 기제다. 주로 대통령선거 과정이나 대규모 사회운동의 경험을 통해 환경의식은 그 시대의 나이테로 자리잡는다.
‘독일은 왜 잘하는가, 성숙하고 부강한 나라의 비밀’의 저자 영국의 방송인 존 캠프너(John Kampfner)는 1970년대 독일의 녹색 운동을 통해 반핵과 광범위한 환경운동이 연계되며, 독일의 접근 방식이 영국, 미국 등과 노선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 녹색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이자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활용 등 환경에 대한 모든 시도를 허용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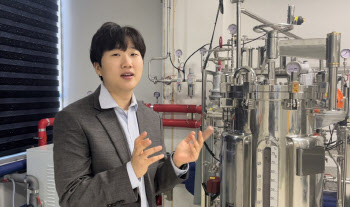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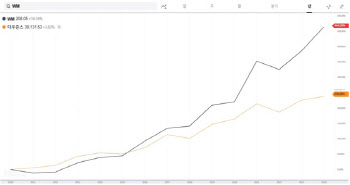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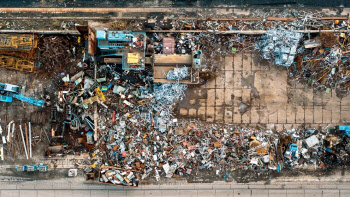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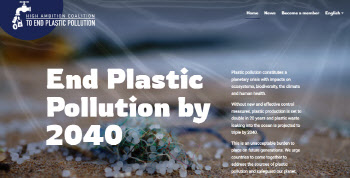








![[포토]'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701261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701048t.jpg)
![[포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700871t.jpg)
![[포토]한동훈-추경호, '최고위 참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700670t.jpg)
![[포토] 출근길 쿠첸 직원, 아침밥 먹기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700641t.jpg)
![[포토] 최혜진 '우승이 필요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600136t.jpg)
![[포토] 농협, '쌀밥의 오해와 진실' 주제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601352t.jpg)
![[포토]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601006t.jpg)
![[포토] CBDC 실증 협약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600981t.jpg)
![[포토]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600959t.jpg)

![[포토] 황유민 '이번주 대회 많관부 부탁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0600142h.jpg)


